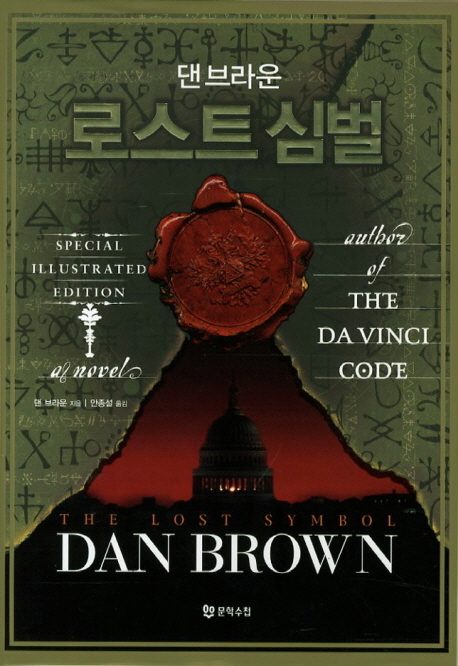***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소년과 소녀가 있었다. 소년은 열여덟 살이고, 소녀는 열여섯 살이었다. 그다지 잘생긴 소년도 아니고, 그리 예쁜 소녀도 아니다. 어디에나 있는 외롭고 평범한 소년과 소녀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는 100퍼센트 자신과 똑같은 소녀와 소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어느날 두 사람은 길모퉁이에서 딱 마주치게 된다.
"놀랐잖아, 난 줄곧 너를 찾아다녔단 말이야. 네가 믿지 않을지는 몰라도, 넌 내게 있어서 100퍼센트의 여자아이란 말이야"라고 소년은 소녀에게 말한다.
"너야말로 내게 있어서 100퍼센트의 남자아이인걸. 모든 것이 모두 내가 상상하고 있던 그대로야. 마치 꿈만 같아"라고 소녀는 소년에게 말한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질리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이야기를 계속한다. 두 사람은 이미 고독하지 않다. 자신이 100퍼센트의 상대를 찾고, 그 100퍼센트의 상대가 자신을 찾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 약간의, 극히 사소한 의심이 파고든다. 이처럼 간단하게 꿈이 실현되어 버려도 좋은 것일까하는......
대화가 문득 끊어졌을 때, 소년이 이렇게 말한다.
"이봐, 다시 한 번만 시험해보자. 가령 우리 두 사람이 정말 100퍼센트의 연인 사이라며, 언젠가 반드시 어디선가 다시 만날 게 틀림없어.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에도 역시 서로가 100퍼센트라면, 그 때 바로 결혼하자. 알겠어?"
"좋아"라고 소녀는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시험해볼 필요는 조금도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100퍼센트의 연인 사이였으니까. 그리고 상투적인 운명의 파도가 두 사람을 희롱하게 된다.
어느 해 겨울, 두 사람은 그해에 유행한 악성 인플루엔자에 걸려 몇 주일간 사경을 헤맨 끝에, 옛날 기억들을 깡그리 잃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의 머릿속은 어린 시절 D.H.로렌스의 저금통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현명하고 참을성 있는 소년, 소녀였기 때문에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다시 새로운 지식과 감정을 터득하여 훌륭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정확하게 지하철을 갈아타거나 우체국에 속달을 부치거나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75퍼센트의 연애나, 85퍼센트의 연애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렇게 소년은 서른두 살이 되었고, 소녀는 서른 살이 되었다. 시간은 놀라운 속도로 지나갔다.
그리고 4월의 어느 맑은 아침, 소년은 모닝커피를 마시기 위해 하라주쿠의 뒷길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해 가고, 소녀는 속달용 우편을 사기 위해 같은 길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 간다.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스쳐 지나간다. 잃어버린 기억의 희미한 빛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 비춘다.
그녀는 내게 있어서 100퍼센트의 여자아이란 말이다.
그는 내게 있어서 100퍼센트의 남자아이야.
그러나 그들의 기억의 빛은 너무나도 약하고, 그들의 언어는 이제 14년 전만큼 맑지 않다. 두 사람은 그냥 말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 그대로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고 만다.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